성육신, 기독교 신앙 핵심 강조
케노시스, 벌거벗은 예수님으로
나체 인물 특징, 종종 오해받아
육체 희생, 기뻐하시는 ‘산 제물’
에드워드 니퍼스(Edward Knippers)는 바로크적 스타일의 인물 군상을 추구하는 화가이다. 새로움의 추구와 충격, 반전을 도모하는 현대 회화의 흐름에서, 그의 존재는 예외적이며 특별하다. 여기에 성경 인물까지 등장시켜 그만의 뚜렷한 정체성을 갖추고 있다.
에드워드 니퍼스는 켄터키주에 있는 복음주의 대학인 애즈베리 칼리지에서 미술 학사, 테네시 대학교에서 회화 석사 과정을 수료하며 정통적인 미술 교육을 받았다.
그가 본격적으로 성경적 주제에 몰입하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 후반부터인데, 이 시기부터 니퍼스는 기독교 신앙의 진리를 자신의 예술적 언어로 표현해야겠다는 소명을 확인하였다. 기독교 신앙 속에서 자신의 예술을 구축한 니퍼스는 신구약 주요 장면들을 강렬하고 역동적인 필치로 구현해냈다.
니퍼스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종의 형체로 오신 ‘성육신’이야말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며, 깨어지고 희생된 육체 없이는 구속과 부활도 없다고 단언한다. 만일 성육신이 실제 시간과 공간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우리의 믿음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반문한다.
그는 ‘케노시스’를 통해 고통과 죽음을 실제로 겪으며 인간과 완전히 연대하신 그리스도의 신체성을 어떻게 시각화할지 고민했다. 그 신학적 고뇌의 끝에 도달한 예술적 응답이 바로 등장인물을 ‘벌거벗은’ 모습으로 묘사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의 그림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미켈란젤로나 루벤스를 연상시키는 거대하고 육중한 신체를 지녔다.
나체 인물을 특징으로 하는 그의 화풍은 종종 기독교인들에게 오해를 받기도 했다. 그러나 그가 나체를 사용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대한 깊은 믿음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그는 신과 인간의 만남에서 인간의 몸을 그 중심에 되돌려 놓고자 한다.
(Pest House, Christ heals the sick,1989)에서 우리의 시선은 한 남자의 나체 뒷모습에 집중된다. 그림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그리스도이다.
그리스도는 질병의 고통과 위험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고통 속에 함께하시며 만지고, 안아주고, 치유하는 중이다. 이 작품은 우리 그리스도께서 가장 파괴적인 상황 속에서도 함께하신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이처럼 니퍼스가 성육신을 힘주어 강조하는 것은, 육체가 신앙의 중심이라는 명제를 시각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이다. 그는 그리스도가 입으신 참되고 완전한 육체의 희생을 통해, 비로소 우리의 깨어지고 연약한 몸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질 수 있다는 구속의 신비를 웅변하고 있다.
최초의 인간이 누드로 지음받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으나, 타락 이후 수치심을 가리기 위해 옷을 입게 됐다는 사실은 누드화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일차적 근거가 된다. 그러나 니퍼스가 누드를 고수하는 이유는 단지 태초의 회복에만 머물지 않는다.
그가 누드를 내세우는 또 다른 이유를 숙고할 수 있다. 성경 속 인물에게 고대 로마 복식이나 중세 옷을 입히면 그들은 역사 속 특정 시점에 갇히게 될 것이므로, 니퍼스는 누드를 통해 이들을 시공간을 초월한 보편적 인간의 실존으로서, 그리고 구속받은 존재로서 현현시키고자 했다.
니퍼스의 예술에서 주목할 또 다른 점은 성육신 사건의 현장성이다. 서구 기독교 미술에서 그리스도의 몸은 종종 연약하고 고통받는 모습으로 묘사되어 왔다. 니퍼스 역시 이 전통을 계승하되, 이를 단순한 고통의 표현을 넘어선 구속적인 사건으로 바라본다.
(1996)는 고전적인 책형도와 사뭇 다르다. 어떤 미화도 없이 십자가 사건의 참혹함을 포착한 이 작품은 바로크 회화의 역동적 구도와 강렬한 콘트라스트를 구사한다.
가시 면류관을 씌운 병사들이 해머로 대못을 박는 장면은 충격적인 시각 경험을 안겨준다. 그리스도의 몸이 외부의 물리적 폭력에 튕겨나갈 듯 묘사된 것은 우리의 죄가 가한 폭력의 실재를 반영하며, 이 처절한 현실 없이는 부활의 영광도 없다는 진실을 웅변한다.
동료 화가 브루스 허먼(Bruce Herman)이 지적했듯, 깨어지고 상한 몸은 하나님이 인간의 고통과 완전히 연대하고 계심을 보여준다. 그의 작품은 그리스도의 고통과 약함을 통해 새로운 언약의 핵심, 즉 멀리 떨어진 신이 아니라 고통받는 인간들 속으로 들어오신 하나님의 현존을 시사하며, 그 고통과 약함을 통해 아름다움이 해방되고 부활의 희망이 암시된다(Bruce Herman, “A Hint Half-Guessed”, Embodied Faith and the Art of Edward Knippers 학술심포지엄, 고든-컨웰 신학교, 2024. 9. 21).
또 니퍼스의 성육신 예술은 현대 사회가 인간의 몸을 다루는 방식에 대한 문제의식도 제기한다. 현대 사회는 스크린 속 가상 이미지에 몰두하며 실제적이고 물질적 존재인 ‘몸’에 대한 접촉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다.
팬데믹과 비대면 회합을 거치며 이러한 경향은 한층 가속화됐다. 인간적 관계와 종교적 의식조차 가상 세계로 옮겨가면서 현실 세계의 물리적 존재를 회피하는 ‘탈육신화(Excarnation)’ 경향이 날로 고조되고 있다. 가상 세계의 매끄러운 픽셀에 익숙해진 현대인들에게, 니퍼스가 묘사한 거칠고 땀 흘리며 상처 입은 육체는 잊고 있던 ‘물질적 실재’와 ‘접촉의 신비’를 일깨운다.
물론 그의 작품이 탈육신적 현실에 대한 비판에만 머무는 것은 아니다. 화면 배경에 스테인드글라스나 입체파적 화풍으로 겹쳐지는 색채들은 이 세상과 저 세상을 가르는 ‘영원한 휘장’에 대한 시각적 은유이다. 아내 다이엔을 떠나보낸 후 그는 다가올 미래 즉 영원의 세계에 한층 더 주목하게 됐고, 이는 인간의 인식을 초월하는 ‘영광’을 표상하는 화풍으로 이어졌다.
니퍼스는 제임스 로메인(James Romaine)과 나눈 대담 『은혜의 대상들』(Objects of Grace)(Square Halo Books, 2002, 74-93쪽)에서 현대 예술이 형식적인 완벽함이나 자기 참조적인(Self-referential) 실험에만 머무르는 경향을 경계했다.
세상이 혼돈과 무질서로 기울고 있는데 조형적 유희에만 침잠하는 것은 예술 본연의 자세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는 예술이 단순한 형태적 탐구를 넘어 인간의 가장 근본적 질문에 답하는 의미와 내용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성경적 서사를 다루는 그의 작업은 책임 있는 예술의 역할을 보여준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제라드 맨리 홉킨스(Gerard Manley Hopkins)가 노래한 “만물 깊은 곳에 살아있는 지극히 귀한 신선함”을 떠올리게 된다. 인간의 오명과 노역으로 대지가 더러워졌을지라도, 성령께서 ‘따스한 가슴과 빛나는 날개’로 세상을 품고 계시기에, 아침은 다시 솟아오른다.
니퍼스의 그림 또한 상처 입고 벌거벗은 육체라는 처절한 현실 위로, 홉킨스가 예찬한 하나님의 위엄과 부활의 소망을 투영한다. 결국 그의 예술은 깨어진 피조 세계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육체의 언어로 증명해 내는 성육신적 응답이라 할 수 있다.
서성록 명예교수(안동대 미술학과)
📰 출처: 크리스천투데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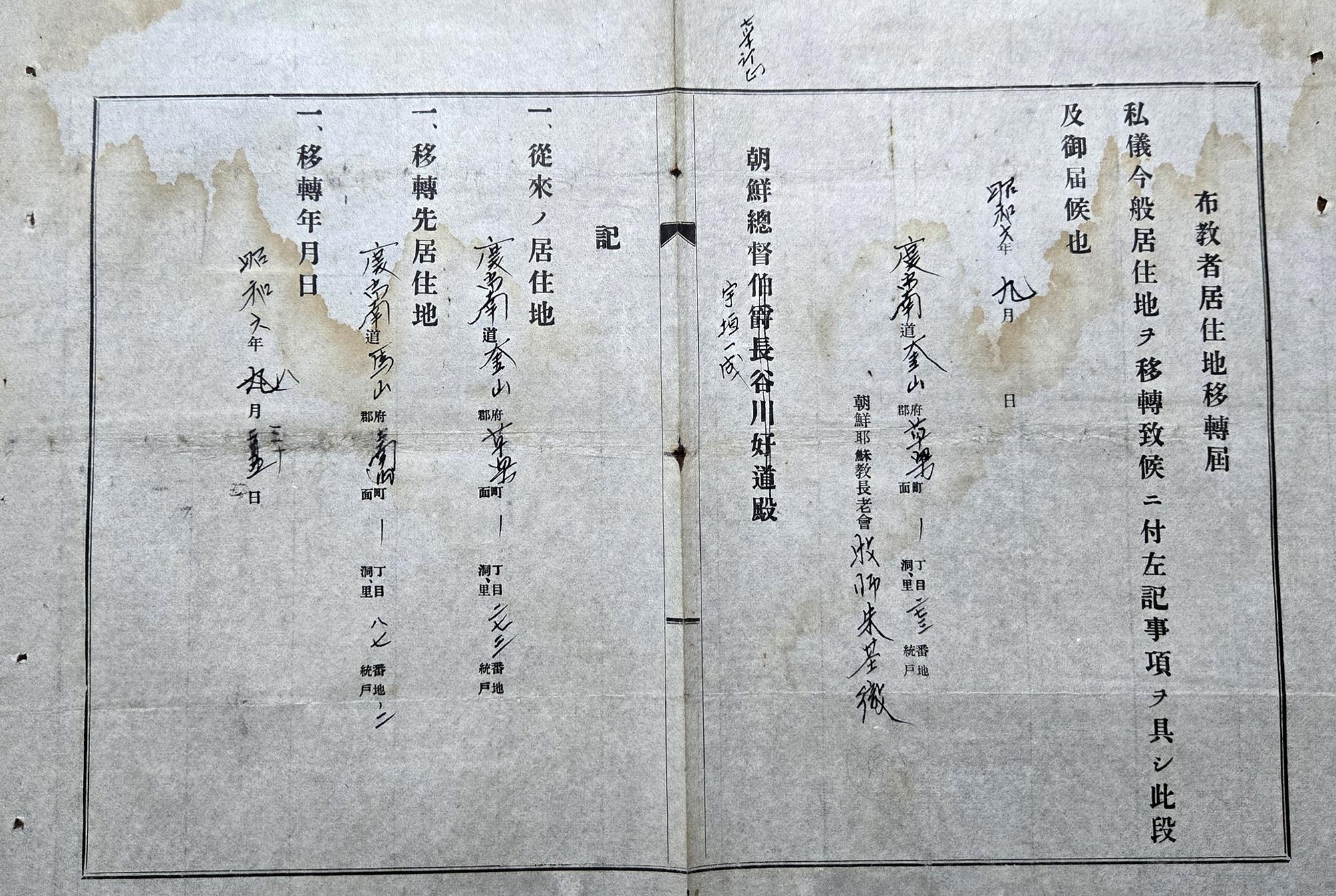



![[사설] 교회와 교회 연결하는 ‘회복의 다리’](https://download.hcjoyn.com/2026/02/joyn-newsimages/202602/files-14792-802af1e101ee1.jpg)